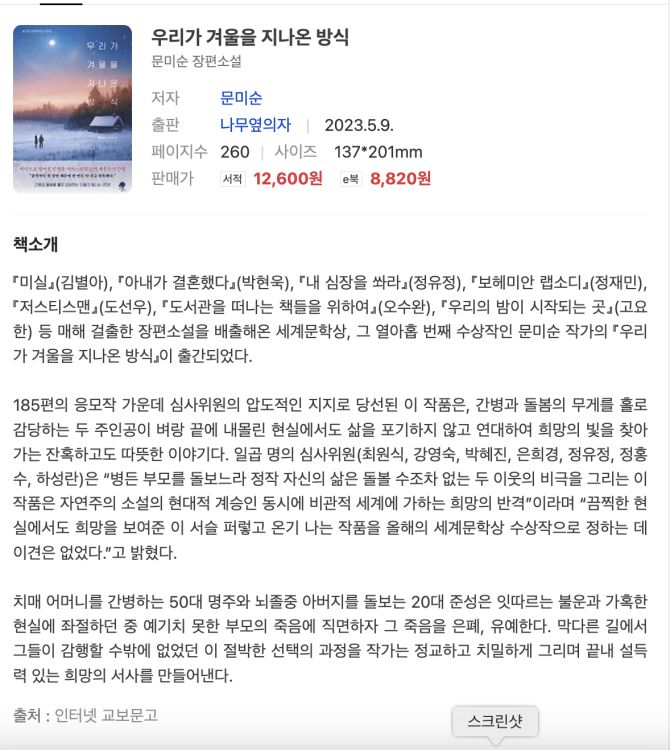지인의 추천으로 알게 된 소설.
겨울이 가기 전에 읽으면 좋을 것 같다고 날이 따뜻할 때 읽는다면 감상이 달라질 것 같다는 후기에
여름나라에 살고 있지만 2월 중에 읽어야지 생각했던 책이었다.
잠 안오는 밤에 읽기 딱 좋은 얇은 소설이었다.
문미순이라는 작가는 처음 들어봤는데
세계문학상 수상작이라는 정보만 듣고 읽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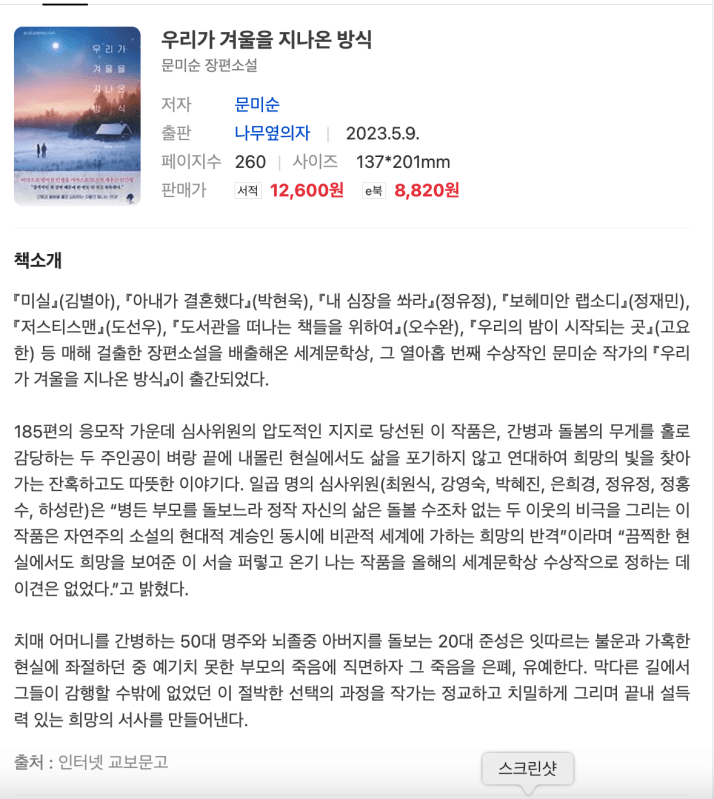
소설은 시작부터 무겁고 읽는 내내 마음도 몸도 춥게 느껴진다.
‘엽기적이다’라는 단어가 오래간만에 머릿속에 떠오르고 좀 소름이 끼치기도 했다.
그렇지만 소설에서는 과한 묘사보다는
그저 덤덤하게 의연하게 독자로 하여금 상황에 이끌려 가도록 만든다.
‘이게 정말 최선이었을까’를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다.
아마 ‘명주’의 육신이 온전했더라면 납득이 어렵고 금방 비난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을텐데
일하다가 화상을 입었고 계속해서 고통에 시달리는 설정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납득된다.
끝없이 신체적 고통이 느껴져서 괴로운 상황에서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력을 기대한다는 것이 가혹하니까.
노동력을 상실해서 내 한몸 건사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안쓰러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도록 작가가 명주라는 인물을 잘 만들어냈다.
금반지를 팔아서 어떻게든 남의 돈을 돌려주려고 하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됐는데도 끝까지 조의금으로 결국 돈을 돌려주는 모습에서
의아스럽고 답답하다가도 인물이 점점 가엽게 느껴진다.
유일한 혈육이지만 악역에 가까운 명주의 딸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보면서
(그래도 딸 덕분에 엄마 소유의 땅을 알게 되기는 한다)
차라리 아무것도 딸린 것 없어서
이제 자기 삶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준성’의 처지가 좀 낫다라는 생각도 들었다.
가족이란 뭘까. 혈육이 뭘까를 생각하게 한다.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준성’을 모른척 할 수 없었던 명주의 마음도 공감이 갔다.
그래서 제목이 ‘우리’구나.
‘준성’의 아버지가 죽는 장면이나
‘명주’의 엄마가 죽는 장면에서
‘그래 어쩔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인물들을 신문 사회면에서 접했다면 끔찍한 사이코라고,
천륜을 저버린 살인자가 아니겠냐고 맹비난 했을 것 같다.
현실에서는 노인의 죽음이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꼼짝없이 존속살해범이 되어 비난과 처벌을 받아야 할 인물들의 상황이 그려지고
또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고로 위장한 살인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돌봄 노동에서 해방되고 연금만을 손에 얻고 싶어서 저질러지는 살인과 시체은닉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
노인 학대의 문제도 생각해볼만 하다.
소설에서는 명주와 준성의 입장에서 서술되니까
분노의 원인이 충분했고 화를 꾹꾹 눌러 참아서
부모에게 손을 대는 일,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는 일은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 한해서,
후회와 깊은 자책감을 남긴 특별한 일로 남았지만
장기화 되면 누가 그렇게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을까,
서로에게 인간 밑바닥을 내보이는 극한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 그려져서 슬펐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데,
스스로를 돌볼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누구의 몫으로 떠넘길 것인지
고민을 진작에 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건 아닌지.
지금처럼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가족의 몫으로만 남겨뒀다가는
더 이상 이 소설이 충격이 아니라 그냥 대롭지 않은 사회적 현상으로 서서히 바뀔지도 모를 것 같다.
얼마전에 읽었던
<좋은 불평등>에서
노후소득 보장과 생존의 결합은 4가지가 있다고,
가족 복지, 사회복지, 일자리 복지, 빈곤에 의한 자살이고 이를 벗어나는 경우는 없다고 했는데
유럽 고령자와 비교해서 한국 고령자들이 보이는 특징이 참 서글펐다.
장편소설 치고는 두께도 얇고, 어려운 내용도 없어서 정말 금방 읽을 수 있는 소설이었다.
지금은 충격적인 소설의 내용이
몇년만 지나면 담담하게 받아들여질것 같아서 두려운,
그런 소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