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다녀온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발견하고선 언젠가 읽어야지 생각했던 책.
‘몸으로 읽는 세계사’를 읽었다.
작가의 이름은 사실 처음 들어봤고,
최재천 교수님의 추천사를 보고 흥미를 느꼈다.
(역시 띠지는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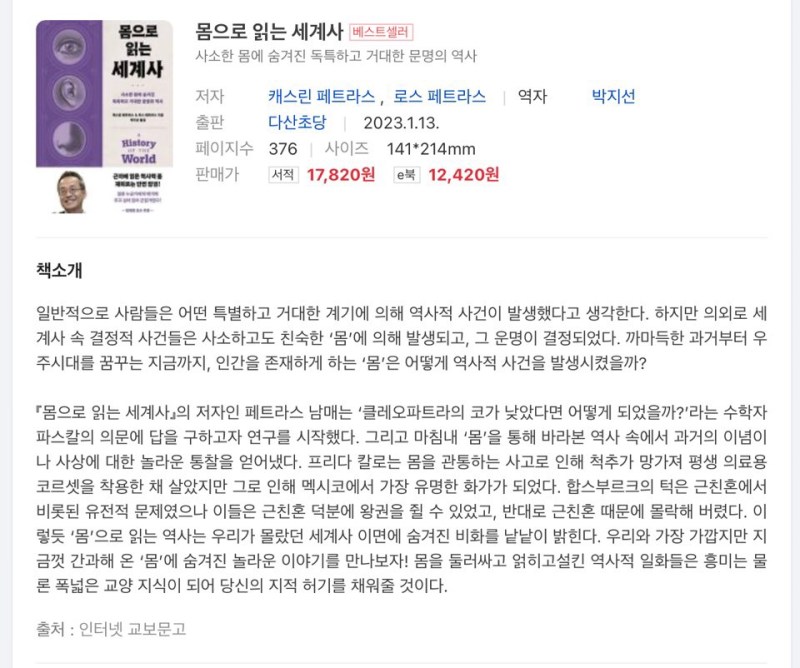
부제는 ‘사소한 몸에 숨겨진 독특하고 거대한 문명의 역사’ 인데,
읽으면 읽을 수록 ‘전혀 사소하지 않은 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언젠가 유발 하라리의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인간은 몸을 결코 벗어날 수 없구나’를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김영하의 소설을 읽으면서
‘내 몸을 벗어나 의식만 저장된다면 그걸 나라고 부를 수 있을까’를 생각했었는데
그 연장선 상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됐다.
물론 세계사 책이니, 세계사에 굵직한 흔적을 남긴 인물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정리해보자면,
세계사의 흔적을 남긴 인물들의 몸이 그 사람에게, 그리고 세계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를 탐구한 책이다.
결국 워싱턴은 그들을 비롯해 마운트 버넌의 노예들을 모두 자유롭게 해주었는데, 노예를 소유한 미국 헌법 제정자들 중 이렇게 한 사람은 그가 유일했다. 그는 1799년 유언장을 통해 마운트 버넌의 모든 노예들을 풀어주라고 지시했다. 단, 시점은 그가 사망한 뒤였다.
위의 인용은 챕터 15. 워싱턴의 의치 부분의 결말부이다.
본인의 몸에 대한 소유권, 자유권에 대해 생각해 볼만 했다.
노예의 치아를 이용한 틀니라니. 살아있는 사람의 치아를 발치해서 틀니를 만든다니. 소름이 끼쳤다.
진부하지만 영화 ‘아일랜드’가 떠오르기도 하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치의학 분야의, 미국의 대표 위인의 어두운 모습이었다.
그리고, 시대를 앞서간 의식과 신념을 가지는 것과
그에 대한 실천의 정도는 별개라는 걸 가끔 잊어버리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챕터였다.
인류가 실제로 별에 (앨런 셰퍼드의 경우에는 이보다 약간 낮은 이온층에) 도달할 수 있다 해도, 우리에게 저마다 고유한 행동 지침과 요구가 있는 몸이 있다는 사실에서는 여전히 벗어날 수 없다. 비록 그것이 보잘것없는 방광일지라도.
위의 인용은 챕터 27. 앨런 셰퍼드의 방광 부분의 결말부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배변활동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역시나 흥미진진했다.
챕터가 굉장히 짧고, 흥미롭게 서술되어 있고
300 페이지가 넘는 책 두께에 참고문헌이 꽤나 많은 비중을 차지 하기 때문에
정말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다.
읽으면서 더 알아보고 싶은 인물들의 경우는 옆에 위키백과를 열어놓고 검색하면서
자꾸 책의 본문과는 멀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읽는 것이 오래걸릴 수도 있고,
이 챕터가 ‘이렇게 짧고 간단하게 끝이라고?’ 하는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그렇지만 딱 이러한 지점이 이 책이 더 성공하는(?) 포인트가 된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굳이 순서대로 읽어야할 이유도 없다.
세계사로 시간순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흥미로운 제목 순으로 읽어도 사실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주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큰 재미를 느끼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었다.
후회없는 독서. 추천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