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을 약속한, 읽어야하는 책들을 제쳐두고서
정말 오래간만에 그냥 눈길이 가는 대로 소설을 하나 골라서 읽었다.
어제 읽기 시작했는데 정말 잔잔하면서도 묘하게 계속 끌리고
마치 ‘윌리엄 스토너’라는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의 인생 전부에 대해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계속 생기면서
책을 놓지 않고 이틀 만에 다 읽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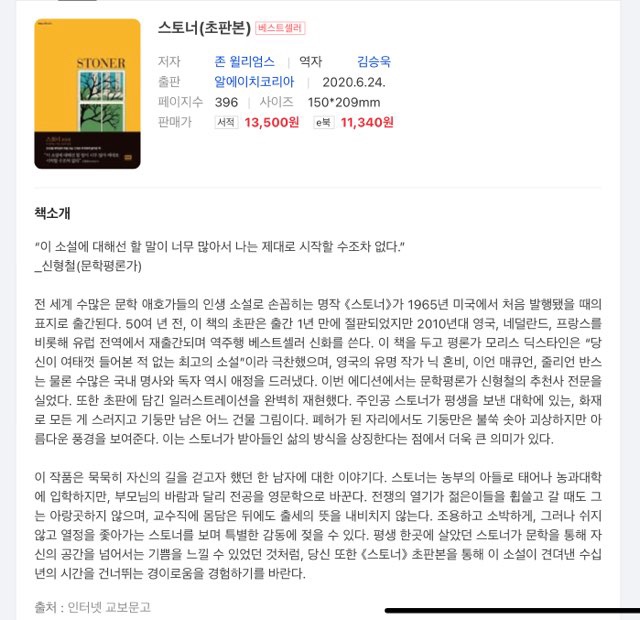
왜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 소설로 손꼽힐까.
스토너를 향해 샘솟는 애정
‘스토너’라는 사람의 삶의 방식에 대한 애정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서 그런 것 같다.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작가는 말하지만,
알면 알수록 짠하게 느껴지는 그런 인물이다.
어쩌면 부모로부터 감정의 표현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야심을 드려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걸
어릴 때부터 못해봐서
그저 묵묵하게 버티는 것만 배운 그런 인물로 생각된다.
대학이라는 공간도 결국은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사회인데,
워커나 로맥스 같은 인물에 대한 스토너의 대처가 너무나 아쉽다.
보는 나는 아쉽지만 스토너 본인은 또 그럭저럭, 묵묵하게 견뎌 내는 것도 답답함을 더해준다.
답답해서 한마디 하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원하는 분야를 전공해서, 큰 생계의 위협 없이 하고 싶은 공부를 계속 하면서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만들어나가고
가정에서 만들어내지 못한 열정과 사랑을 찾아 일탈 행위도 하면서
큰 부침 없이 본인의 삶을 끝마친 스토너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도 있다.
이디스는 왜
아름다운 눈을 가진 스토너의 아내 이디스.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혼을 해도 되는 것인지, 불안불안하게 읽어나가다가
‘그럼 그렇지’하는 마음으로 체념하게 만드는 이디스와 스토너의 결혼생활.
해도해도 이디스는 스토너에게 너무하다 싶은 행동들을 하고
스토너는 그저 묵묵하게 견디는 방식 외에는 돌려주는 것이 없으니
이디스를 더욱 자극하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감정의 영역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생활 공간, 시간까지 모두 빼앗아 버리는 아내를
주인공은 왜 끝까지 놓아버리지 못하는 걸까.
이디스의 입장에서 스토너와의 생활은 또 얼마나 숨이 막혔을까.
두 사람 모두 부모로부터 정상적인 애정표현, 소통능력을 배우지 못하고 자라나서
그저 불행이었다고 밖에는 표현되지 않는다.
그 긴 시간을 서로의 배우자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괴롭히고 버티는 것 말고는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다니.
마지막 순간에는
스토너의 마지막 순간에는
책이 함께 한다.
이디스도, 그레이스도, 캐서린도 곁에 없다.
스토너와 참 어울리는, 그런 결말의 순간이었다.
소설을 읽으면서, 스토너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다보니
점차 노쇠해지는 그의 심리와 생각들을 따라가면서 엄청나게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과연 내 마지막 순간에는 곁에 뭐가 있을까.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나?
이렇게 반전 없이, 큰 곡절 없이 흘러가는 한 사람의 인생을 지켜보는 듯한 경험을 하다니.
극적인 내용을 다룬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오히려 낯선 느낌이 드는 소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