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의사들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
정신과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그런 것일까.
정신과 치료 또는 상담을 겪은 일을 솔직하게 적어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도 많아지는 걸 보면 정신과라는 문턱이 점점 낮아지고 가까워지는 것 같다.
제목을 잘 지은 책이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 위한 책’이라는 제목은 머릿말에서 작가가 밝힌 대로 ‘예민한 사람들의 마음을 약간 평평하게 해주는 책’이라는 컨셉으로 이목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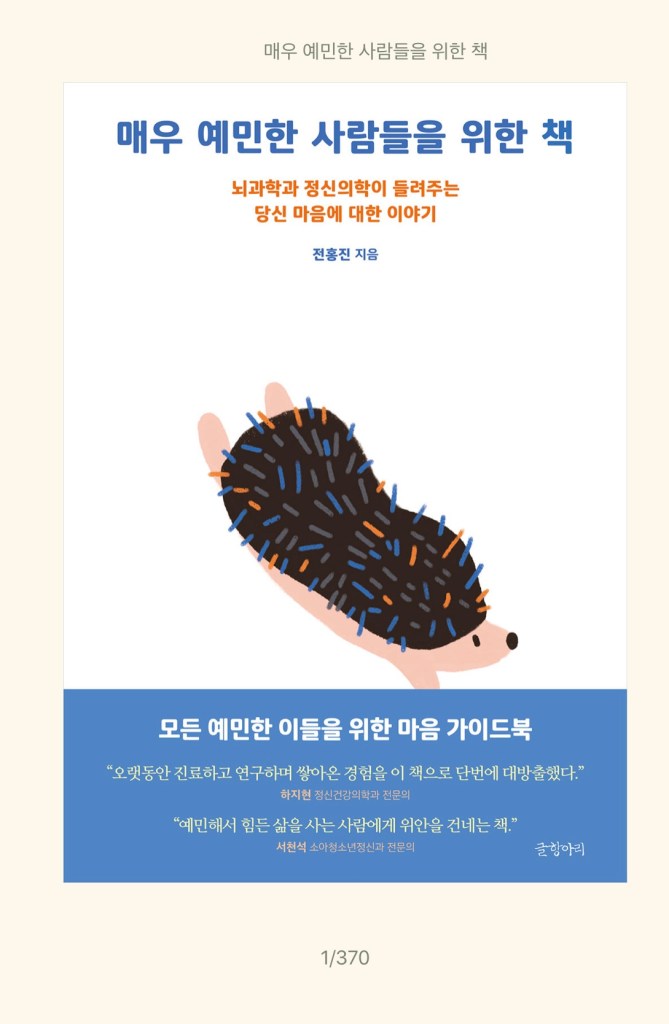
외국 작가가 쓴 책이 아무래도 사례들이 와닿지 않고 문화적으로 다른 면이 많아서 거리감이 느껴지는 경우도 많은데 작가가 밝힌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분석 및 사례들이 실려있어서 도움이 됐다.
의료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경고하에 스스로 자가진단 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실려 있어서 나 스스로를 들여다보며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결론은 나는 그다지 예민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결론이 나와서, 그럼 난 이 책을 왜 읽은거지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유익했다.
다만, 다 읽고 나니 정신과 의사들이 쓴 책을 당분간은 안 읽고 싶어졌다.
그 이유 첫번째, 어쩔수 없지만 어려서부터 엄마한테 듣던 말들 즉, 건강한 삶의 습관을 돈주고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다시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유 두번째, ‘3개월 병가’ 조언이나, ‘출판사 취업’ 조언에서 아 작가가 아무래도 한 평생 공부만 하셔서 그런지, 2020 대한민국의 현실을 얼마나 모르는지를 생각하게 됐다. 그리고 작가가 만나 사람들,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의 현실이 얼마나 극소수 계층의 현실만을 대표하는지를 생각하게 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당장 내일 일을 쉬면 생계가 위협 받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힘들어도 정신과 문턱을 넘지 못하고 참으며 살아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 그대로 예민한 사람들 위한 한국 버전의 책이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었다.
돈주고 오랜만에 이북을 사서 읽었는데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본인이 예민하다고 느끼며 살아왔다면 나보다는 훨씬 더 이책을 유익하게 읽을 것 같다. 정말 제목 그대로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