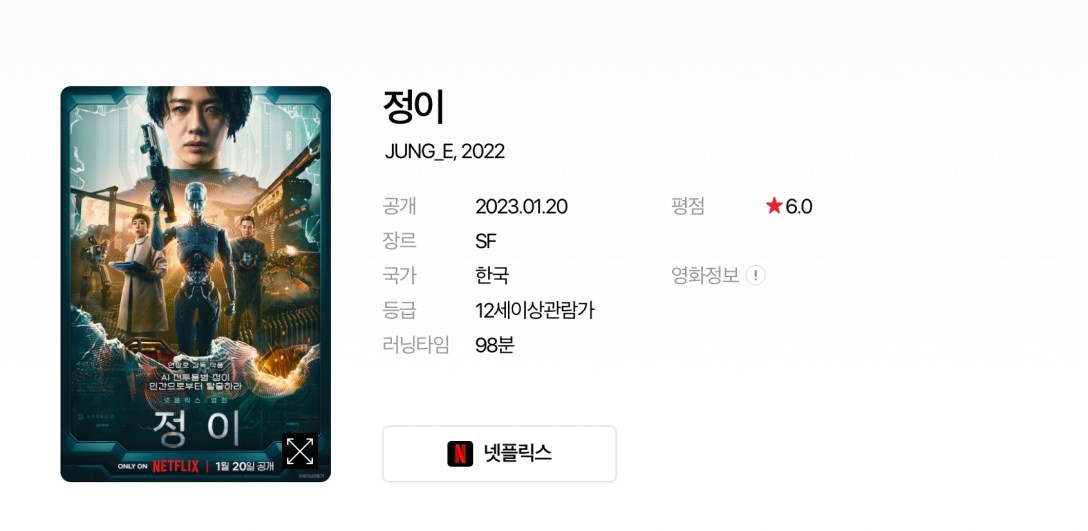연상호 감독의 영화는 ‘부산행’ 말고는 본 적이 없지만,
김현주 배우, 강수연 배우의 활약을 보고 싶은 마음에 ‘정이’를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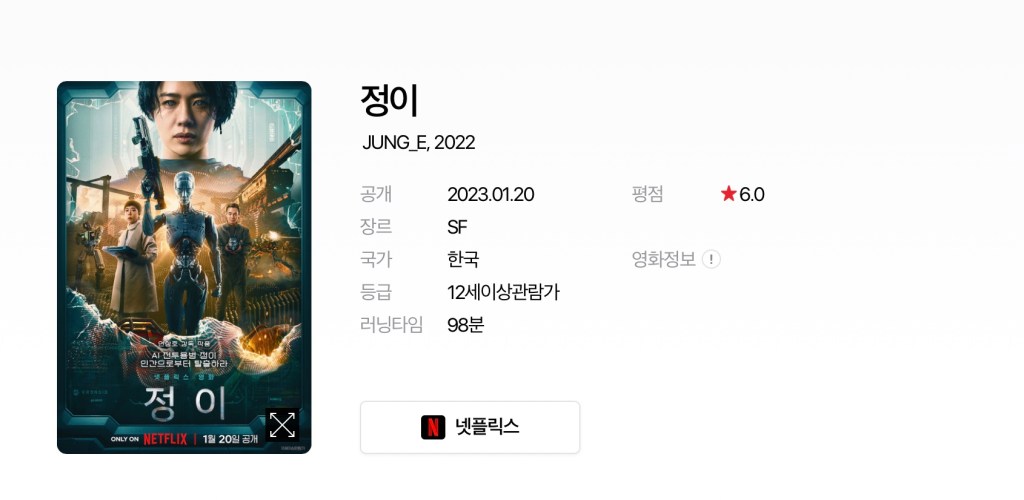
에스에프 영화를 감상 할 때는 컴퓨터그래픽이나 다른 요소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까.
서사에 중심을 두고 생각해보자면
사실 정말 뻔한 스토리였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가능하지만
예측가능함 속에서도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럭저럭 만족스러운 영화였다.
첫번째 생각
군수AI 개발이라니,
개발해놓고 감당할 수는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바로 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사의 로봇이 걷고, 뛰고 공구상자를 던져주는 모습을 보고
저 상자를 인간을 향해 던지면 어떻게 되는걸까하는 비극적 상상을 했었는데
‘정이’를 보니 바로 어제 본 그 장면이 생각났다.
정이를 보면서,
너무 좋아서 극장에서 2번이나 관람한 영화 터미네이터:다크페이트(2019)도 많이 떠올랐다.
설정상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주인공들의 서사나, 미래기술 구현퀄리티를 비교하면서 보게 된다.
두번째 생각
죽음이란 뭘까.
나의 죽음이란 내 뇌가 영원히 쉬는 것을 의미하는걸까.
작년에 읽은 김영하 작가의 소설 <작별인사>에서도
죽음이 무엇인지, 어디까지를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했는데
영화 ‘정이’도 마찬가지였다.
가진 자본에 따라
A, B, C타입으로 나뉘는 뇌복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영화적 상상이 꽤나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가까운 미래에 맞이할 우리 인간들의 죽음은
개인이 가진 자본에 따라서, 또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그 방식이나 타이밍에 세세하게 유형화되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에서는 특히
본인의 뜻도 아니고 유족의 뜻에 의해 C타입으로 뇌가 복제된 사람의 인간존엄성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보게 한다.
무감정한 얼굴, 어마어마한 파괴력으로 인간을 공격하는 로봇들보다도
복제된 타인의 뇌로 돈벌이 수단, 쾌락 수단이나 만들어내는 인간들이 좀 더 소름끼치고 무섭게 느껴졌다.
‘정이’에서 그려지는 미래 사회라면 정말 아무것도 남기는 것 없이
그저 단번에 뇌 기능이 멈추거나 파괴되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게 더 평화롭겠다는 상상을 하게 된다.
물론 이런 고민을 깊이있게 하기에 영화는 꽤나 속도감 있게 전개되니까
딱 즐기는 오락 영화로 봐도 괜찮았다.
최근에 본 다른 영화들에 비해 러닝타임도 짧은 편이다.
왜 엔딩을 이렇게 설정했을까,
혹시 후속편이 나오는 건가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건 아직 잘 모르겠다.
기대한 건 김현주 배우의 액션과 화려한 그래픽이었는데
그 기대를 아예 충족시키지 못한 건 아니지만,
의외로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