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이었나, 웹서핑을 하다가 백석 시인이 꽤나 최근까지 살아계셨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가 흔히 아는 ‘모던보이’ 이미지의 청년기 사진과는 사뭇 다른…
깡마른 노인의 모습으로 찍힌 사진을 보게 됐다.
문학 교과서에 실린 청년기 사진의 모습과는 정말 너무나 달라졌지만 눈빛이 아름다운 노인이셨던 것 같다.
윤동주 시인이나, 이상 시인처럼 청년기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신게 아니라
생각보다 꽤 현재까지 살아계셨고 자유롭지 못한 북한 사회에서 작품 활동도 하셨다는 사실에 놀라웠었다.
독서를 장려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비밀독서단’ 이었을까, ‘알쓸신잡’ 이었을까.
그때 소개된 안도현 시인이 쓴 백석 평전을 읽으면서
‘미남 작가’를 넘어 인간적인 매력을 느꼈던 작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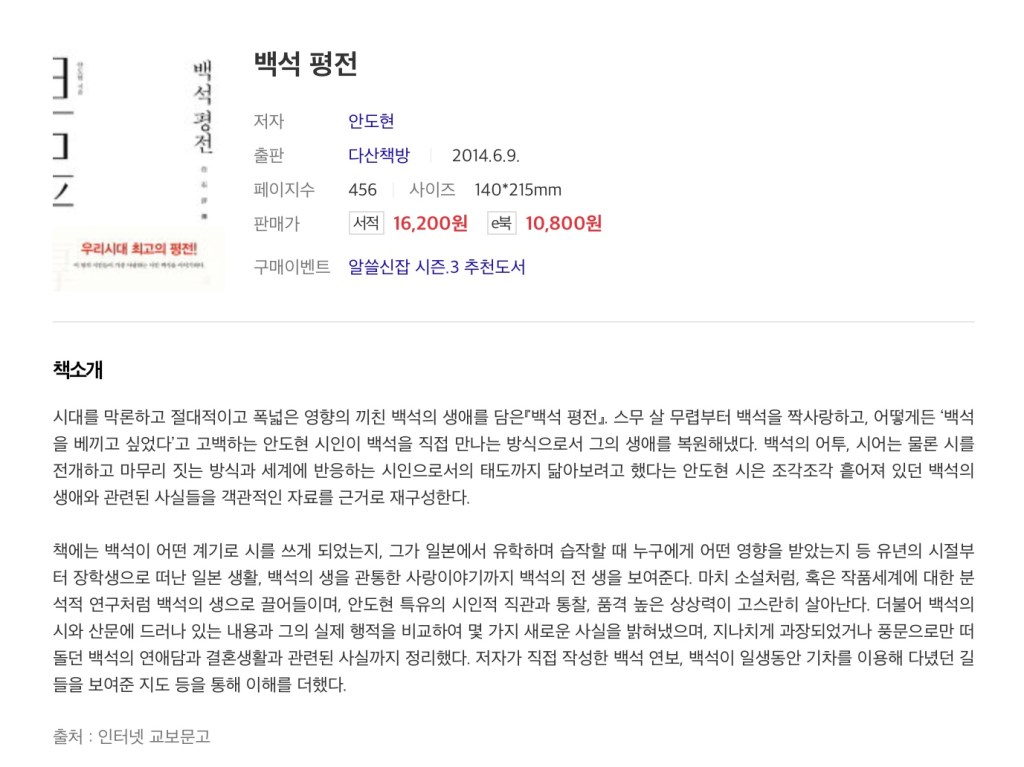
알라딘에서 사은품이었는지, 제품이었는지
<사슴> 을 발행해서 문학수업을 진행하며 아이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었다.
적으면서 떠올려보니 벌써 시간이 많이 흐른 추억들이고,
어느샌가 나는 ‘시를 잊은 국어선생’이 되어 메마른 ‘비문학 전담’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깔끔한 맛은 있지만 건조하기 짝이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김연수 작가의 소설은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다. 헤아려보니 이번이 세번째인듯.
작가가 김연수라서가 아니라, ‘백석’을 소재로 했다는 점에 끌려서 읽게 된 책이었다.
“어디까지가 실제로 벌어진 일이고 어디까지가 백석이 직접 남긴 글이지?”
끝날 때까지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다.
‘그럴듯하게, 사실에 가깝게 만든 허구’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질문하게 된다.
당은 생각하고 문학은 받아쓴다는 것. 그러자면 쓰는 동안에는 생각하지 말아야만 했는데, 기행은 그게 잘 되지 않았다. 비판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자아’가 너무 많았다. 그 자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그들은 말했다.
수단화된 문학이, 당과 사상이 최우선되는 사회에서 작가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오로지 잘 팔리는, ‘자본의 수단으로써 책’도 문제가 있다지만 그래도 여기엔 돈 너머 다양한 사람들의 취향과 선택 문제가 고려되니까 숨통이 덜 막힌다.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을 수 있는 것, 어떤 시를 쓰지 않을 수 있는 것, 무엇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능력은 무엇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었다.
최근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뭔가를 안 할 수 있는 힘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상황과 이유는 다르지만 이 구절이 그래서 확 꽂힌 것 같다.
이제 그에게는 더이상 털어놓을 이야기가 없었다. 하지만 자백위원회의 무대에서 침묵은 유죄의 간접적 증거였다. 비밀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다고 말했던 친구가 누구였지? 그땐 다들 그 친구를 불쌍히 여겼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해방이 되기 전에 요절한 그이가 가장 행복했구나. 상허는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소설을 읽기 전부터
요절한 작가들, 영원히 청년의 이미지로 기억에 남는 작가들과 다르게
해방 후 남에서, 북에서 삶을 이어간 작가들의 해방 후 삶이 어땠을까를 생각했는데
작중 인물들도 분명 그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 같은 상황이다.
왜 그래야만 했는지 묻는 기행에게 이천육백 년 전의 시인이 대답했다. 그 까닭은 우리가 무쇠 세기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 시대에 좌절할지언정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라고. 운명에 불행해지고 병들더라도 스스로를 학대하지 말라고. Ne pas se refroidir, Ne pas se lasser(냉담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그는 그 붓으로 세상의 권력에 맞설 수 있다고 믿었고, 그때는 기행도 그 말에 동의했다. 자신들이 언어를 쓴다고만 생각했지, 자신들 역시 언어에 의해 쓰이는 운명이라는 것을 모를 때의 일이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현실에서 실현되지 못한 일들은 소설이 된다고 믿고 있었다. 소망했으나 이뤄지지 않은 일들, 마지막 순간에 차마 선택하지 못한 일들, 밤이면 두고두고 생각나는 일들은 모두 이야기가 되고 소설이 된다.
백석 시인이 1996년에 돌아가셨다니.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남겨진 글이 더 없는 것이 아쉽고
‘시인의 마지막’, ‘작가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하는 소설이었다.
평전에 비해 훨~~~씬 얇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백석에 대한 ‘상상’을 즐기며 읽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