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소재로 한, 책 읽기를 권하는 유튜브, 팟캐스트 등이 정말 많다.
책을 직접 읽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나는 (책만 읽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
이런 2차 텍스트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장강명과 요조가 진행한다는 팟캐스트가 재밌다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동명의 제목으로 장강명 작가가 책을 낸 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독서모임을 함께 하는 분께서
이 책에 나온 방법이라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책대화를 밴드에 올려주셔서 관심이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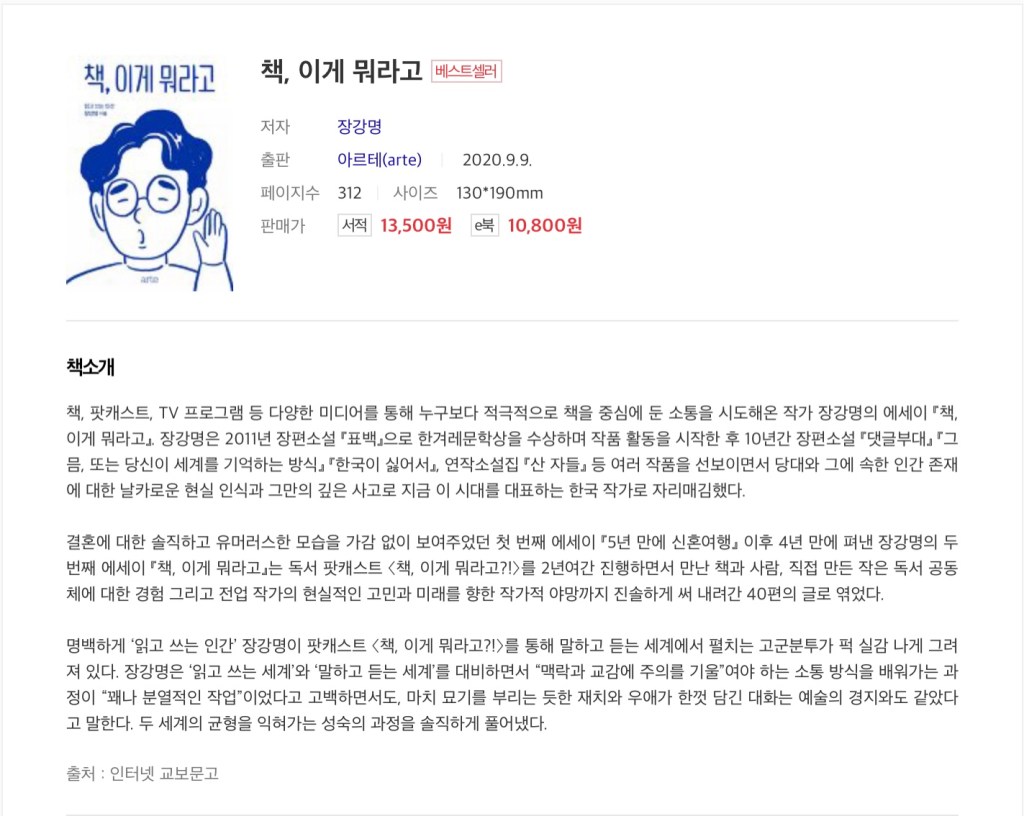
장강명 작가의 작품은
소설 <한국이 싫어서>, <표백>, <댓글부대>, <그뭄,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을 읽었고 꽤나 마음에 들었었다.
하남시 나룰도서관에 강연을 오셨을 때 저자 강연을 들은 경험도 있다.
생각보다 말투가 조곤조곤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어린시절 부모님께서 서점에 가서 책을 한권씩 고르게 해주셨고, 아내분과의 약속과 허락 등 전업작가의 길을 걷게 된 경위도 기억에 남는다.
시인이나 소설가가 쓰는 에세이는 보통 그들의 본 작품보다 실망감을 주기도 하는데
(이 분야의 정 반대라면 김영하 작가? 김영하작가의 소설보다 에세이가 좋았다)
이 책은 좀 달랐다.
말하고 듣는 사람과 읽고 쓰는 사람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 주를 이뤘고,
제목 그대로 ‘책’이란 뭘까, 더 좁혀서 소설이란 뭘까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동시대 한국 사회를 사는 작가님의 목소리가 생생했다.
그리고 특히,
팟캐스트팀과 함께 한 ‘구글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책 대화’를
실용적으로 써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마음에 들었다.
비록 팟캐스트는 단 1회도 듣지 않았고 이제 그만두셨지만
요거 하나는 확실하게 ‘건진’ 느낌이 드는 책이다.
늘 그렇듯이 기억에 남는 문장들을 인용해 본다.
나는 성실히 읽고 쓰는 사람은 이중 잣대를 버리면서 남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 반성하는 인간, 공적인 인간이 된다고 생각한다. 대신 그는 약간 무겁고, 얼마간 쌀쌀맞은, 진지한 인간이 될 것이다. 그사이에 충실히 말하고 듣는 사람은 셀린과 제시처럼 다정하고, 비언어적으로 매력적이 인간이 된다.
리터러시와 관련한 책을 읽으면서, 학교에서 나날이 나와 격차가 벌어지는 세대를 만나면서 느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말하고 듣는 사람 사이에서는 예의가 중요하다. 읽고 쓰는 사람 사이에서는 윤리가 중요하다.
예의와 윤리는 다르다. 예의는 맥락에 좌우된다. 윤리는 보편성과 일관성을 지향한다. 나에게 옳은 것이 너에게도 옳은 것이어야 하며, 그때 옳았던 것은 지금도 옳아야 한다. 그러나 나에게 괜찮은 것이 너에게는 무례할 수도 있고, 한 장소에서는 문제없는 일이 다른 시공간에서는 모욕이 될 수도 있다.
예의와 윤리의 차이가 뭐길래,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갸웃하게 했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설명은 명쾌했다.
말하고 듣는 세계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 자신이라는 한 인간, 한 인격을 판매해야 하는 것 같다. 강연, 방송, 영업, 상담, 정치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기술자나 연구자와는 다른 삶을 산다. 그들은 동시대의 타인들이 보기에 매력이 있어야 한다.
인격을 판매한다는 말에 많이 동감한다.
책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하나의 ‘상품’으로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대인 것 같다.
일단 ‘매력’이 있어야 그 후에 그들의 전문영역도 눈에 들어오고 기회가 생기는 것 같다.
독서 그 자체만큼이나 독서의 전 단계가 중요하다. 아이들이 ‘나는 무슨 책을 좋아하는 사람인가’를 고민하도록 해줘야 한다. 표지가 예쁜 책과 유명인이 쓴 책과 줄거리가 재미있을 것 같은 책 사이에 갈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숙고 끝에 내린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스스로 깨닫는 경험이, 어린이용으로 개작된 고전을 읽고 얻는 고만고만한 교훈보다 훨씬 귀중하다. 세상에 그렇게 안전한 실패도 드물 것이다. 기껏해봐야 약간의 시간 낭비 정도다.
아이들에게 목록을 제시하는 일이 얼마나 해가 되는지,
숙고의 시간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끔 하는 독서교육이 얼마나 부질 없고 애들을 망치는 길인지 또 생각하게 한다.
읽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책이 아니고,
제목 그대로 ‘책’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면서
‘읽고 쓰기’에서 ‘듣기와 말하기’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이 시점에 읽어볼만했다.
